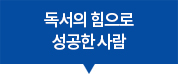▣ 독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
|
김윤환 |
2만권의 책을 읽은 조선 최고의 독서왕 - 간서치 이 덕 무 (1741년 ~ 1793년)
이덕무의 여러 개 호 중에서 대표적으로 불리는 호는 형암(炯庵)이다. 간서치는 그의 호가 아니지만 이름 앞에 붙여보았다. 간서치(看書癡, booklike)는 지나치게 책을 읽는 데만 열중하거나 책만 읽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덕무에게 어울리는 헌사(獻詞)다.
남아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 남자라면 다섯 수레 정도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자(莊子)의 천하편에 나오는 惠施多方其書五車(혜시다방기서오거)에서 유래했다. 장자가 친구 혜시의 장서를 보고 박학다식한 혜시가 많은 책을 읽은 것을 감탄했다. 이 구절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제백학사모옥(題柏學士茅屋)에 인용되어 유명해졌다.
富貴必從勤苦得 부귀필종근고득 - 부귀는 반드시 근면한 사람이 얻으니
男兒須讀五車書 남아수독오거서 - 남자는 반드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하느니라.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장하는 말로, 오늘날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된다.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은 몇 권이나 될까? 옛날 수레는 소나 말이 끌었기 때문에 사람이 끄는 수레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책을 실을 수 있었다. 수레 하나에 약 3,000권의 책을 실을 수 있다고 하니, 평생 읽어야 할 책은 약 7,500~10,000권에 이른다. 이것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책을 읽은 이가 이덕무다.
이덕무는 조선후기 실학자 그룹인 이용후생파 중 한 사람이다.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과 더불어 청나라에까지 사가시인(四家詩人)으로 문명(文名)을 날린 실학자이다. 경서(經書)와 사서(四書)에서부터 기문이서(奇文異書)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출세에 제약이 있었다. 출세를 포기하고 책을 읽었다. 관리가 될 수는 없지만 학자, 사상가는 될 수 있다. 이덕무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는데 해가 지는 방향으로 햇빛을 따라 방안을 옮겨 다니며 책을 읽었다. 햇빛이 드는 쪽이 밝기 때문에 조금씩 옮겨 다닌 것이다.
이덕무는 책을 볼 때는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책을 더 읽어도 안 되고, 시간을 남겨 덜 읽어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의심나는 글자가 있으면 즉시 참고서를 찾아 그 뜻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덕무의 독서 취향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논어》등 경서를 깊이 연구했고 제자백가 사상과 고금의 역사와 문물제도, 음운학, 문집, 의서와 농서, 문자학 등 다방면에 걸쳐 책을 섭렵했다. 백과사전식 독서였다.
이덕무는 여행을 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붓으로 기록했다. 기록해 두면 그게 자신만의 콘텐츠가 되어 언젠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된다. 메모, 즉 기록의 힘이다. 독서는 마음이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슬픈 일이 들이닥쳐도 책을 읽었다.
“지극한 슬픔이 닥치게 되면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하기만하다.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극한 슬픔을 겪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만일 내가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안소영 지음, <책만 보는 바보> 중에서
이덕무의 집은 가난했다. 그러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책을 읽고 또 읽었다. 혼자 중얼거리며 책만 읽어 주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릴 정도였다. 그래서 스스로를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을 가진 ‘간서치(看書癡)’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덕무는 책 읽기의 이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첫째,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두 배로 낭랑해져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둘째, 추울 때 책을 읽으면 소리의 기운이 스며들어 떨리는 몸이 진정되고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셋째,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눈과 마음이 책에 집중되어 천만 가지의 걱정 근심이 모두 사라진다. 넷째, 기침병을 앓을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목구멍을 시원하게 뚫어 주어 기침이 싹 사라진다.”
-안소영 지음, <책만 보는 바보> 중에서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여 서얼출신의 뛰어난 학자들을 등용할 때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과 함께 검서관으로 발탁되었다. ‘규장각’은 나라에서 여러 자료를 모으고 책을 만드는 곳이고, ‘검서관’은 규장각의 책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직책이다.
이덕무는 검서관으로 있으면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이후 쉰세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정조 임금은 그가 남긴 글을 모아 책을 만들라고 어명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아정유고(雅亭遺稿)』다. 여기에 평소에 지은 다른 글들을 모아 합친 책이 『청장관전서』이다.
이덕무의 아들 이광규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검서관으로 활약했다. 이덕무는 원도 한도 없이 평생 책에 파묻혀 책을 읽었다. 그의 노력과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서늘하게 전해지고 있다.
Comments
| *'독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한 우물을 파면 강이 된다 -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로 출간된 도서의 일부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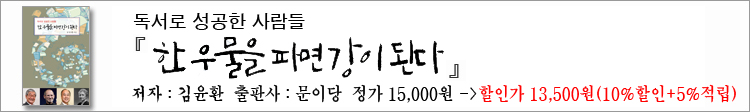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