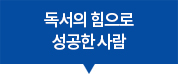▣ 독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
|
김윤환 |
빌린 책을 찢어 벽에 붙여 놓다니! -괴애 김 수 온(1410년∼1481년)
조선초 3대 문장가로 꼽는 김수온은 충북 영동 출신이다. 아버지 김훈의 네 아들 가운데 셋째다. 첫째 아들은 신미대사다. 김수온은 세종과 세조 때의 편찬 및 번역 사업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세종으로부터 문재를 인정받아 집현전 학사로 임명되었고, 성삼문, 신숙주, 이석형 등과 교우관계를 유지했다. 승려인 맏형 신미대사의 영향으로 불교에도 깊은 지식을 가졌다. 불경 번역과 불사에 관계된 많은 글을 남겼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그는 읽은 글은 반드시 암기했다.
김수온은 자신이 가진 책은 다 읽으면 남에게 책을 빌려서 읽었다. 모두가 그에게 책 빌려주기를 꺼려했다. 책을 찢어서 읽고 외우는 버릇 때문이다. 책을 한 장씩 찢어 옷소매에 넣고는 오가며 읽고 외우니, 다 외우면 책도 다 찢어지는 셈이다.
한번은 김수온이 신숙주에게 귀한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빌리러 왔다. 왕이 선물로 준 ‘고문선’ 이라는 책이었다. 신숙주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듭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책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책을 빌려 간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신숙주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방에 가보니 책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천장과 벽에다 빽빽하게 붙여놓았다. 왕이 하사한 귀한 책으로 온통 도배를 한 것이다. 신숙주가 화가 나서 물었다.
“괴애! 이게 무슨 짓인가?”
김수온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서서도 읽을 수 있다네.”
신숙주는 말문이 막혀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책 읽기, 암기하기의 금메달감이다.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추락하는 현실을 보고 김수온은 세종을 도와 불교재건에 앞장선 대표적인 재가불자였다. 세종의 왕사 역할을 했던 신미대사와 함께 두 형제는 조선 초기 불교재건과 한글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면 창제 이후 훈민정음으로 간행된 유교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으로 간행된 서적은 90%가 불경이었다.
훈민정음에는 다빈치 코드처럼 불교적 숫자코드가 깃들어 있다. 훈민정음의 자음. 모음은 28자다. 책자 훈민정음은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민정음 한글 어지는 108자다. 한문 어지는 108의 절반 54자다.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을 올릴 때 33번의 범종을 울린다. 새벽 예불에는 28번을 울린다. 33번은 도리천의 삼십삼천을 상징한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도 하늘의 삼십삼천이 도와야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백용성스님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새벽에 28번 울리는 의미는 윤회하는 세계를 뜻한다.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을 합한 세계를 삼계 28천이라고 한다. 아침. 저녁 울리는 종소리는 지옥의 중생들부터 하늘의 천신의 신들까지 이 소리를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가 자라나 보리심이 생겨나기를 발원한다. 한글을 보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도 무지를 벗어나 지혜로워 지기를 염원했던 창제 동기를 엿볼 수 있다.
불자들이 목에 걸고 손에 쥐고 염불하는 염주는 108개의 열매로 이루어져 있다.우리 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탐한다. 몸으로는 촉각을 느끼고 의식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분별작용을 일으킨다.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안.이.비.설.신.의. 6근이라고 한다. 6근이 보는 대상을 색.성.향.미.촉.법. 6경이라고 한다. 6근이 6경을 접할 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등의 분별작용을 6식이라고 한다. 본래 청정한 성품과 오염된 성품을 염, 정 2문으로 나눈다. 6근.6경.6식을 더하면 18이 되고 염정 2문을 곱하면 36이 된다. 36이 과거.현재.미래.삼세를 곱해서 108번뇌가 된다.
훈민정음의 한글 어지는 108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을 배우고 깨우침을 얻어 모두가 108번뇌에서 벗어나 보는 눈, 듣는 귀가 밝아지고 깊어지기를 염원했을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28자>
자음 17자 : ‘ㄱ·ㅋ· ㆁ, ㄷ·ㅌ·ㄴ, ㅂ·ㅍ·ㅁ, ㅸ·ㅈ·ㅊ, ㅅ·ㅎ·ㅇ, ㄹ·ㅿ’
모음 11자 : ‘ㆍ·ㅡ·ㅣ·ㅗ·ㅏ·ㅜ·ㅓ·ㅛ·ㅑ·ㅠ·ㅕ’
합계 : 28자
<현재 안 쓰는 글자>
‘ㆁ ㅸ ㅿ ㆍ’ : 4개
<훈민정음 한글 어지>
世·솅宗종御·엉製·졩訓·훈民민正·졍音
나·랏 :말·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린 百·姓·셩·이 니르·고·져 ·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 爲·윙··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 ·노·니 :사:마·다 :· :수· 니·겨 ·날·로 ··메 便뼌安·킈 ·고·져 ·미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 한문 어지는 108의 반수인 54자로 구성되어 있다>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야 與文字로 不相流通,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予ㅣ 爲此憫然야 新製二十八字노니, 欲使人人로 易習야 便於日用耳니라.]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고도로 계산된 숫자이다. 불교에서 상징화된 숫자를 훈민정음에 적용한 것이다.
다음은 김수온이 그의 큰형님인 신미대사를 생각하며 읊은 시다.
지난해 고향에서 소매잡고 헤어진 뒤
다시는 뵙지 못하였네.
가을 밤 깊어가고 달빛 고요한데
푸른 산 어디쯤 가부좌를 트셨을까?
그가 남긴 문집 <식우집>에는 불교와 차문화를 전해주는 시가 많다. 그 중 김수온의 높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시 한편을 소개한다.
소나무와 달은 승가의 풍경이고
미혹과 참을 버림이 불가의 원융이라네
일단의 소식처를 말하려 하지만
스님께서 잠잠하시니 내 할 말을 잊었네
늘그막에 관직이 한가하여
누추한 집에 누웠더니
찻그릇과 술잔이 남아 있구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립문을 열어 놓고
아름다운 객을 위해 높은 의자 청소하네
고요함 속에 석가와 노자를 탐구하고
한가한 중에 시서를 담론하네
은근히 다시 백련의 모임을 약속하고
한 해가 저물 때 서로 조아 모임을 맺으리
그는 뛰어난 문장으로 세종을 도와 의학서적인 <의방유취>를 편찬하고 <금강경> 등의 불경을 국역ㆍ간행하였다. 복천사지, 상원사 중창기, 사리영응기, 여래현상기, 대원각사비 등 불교관련 뛰어난 기록을 남겼다.
Comments
| *'독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한 우물을 파면 강이 된다 -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로 출간된 도서의 일부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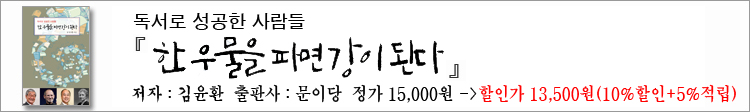 |